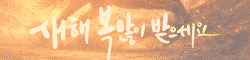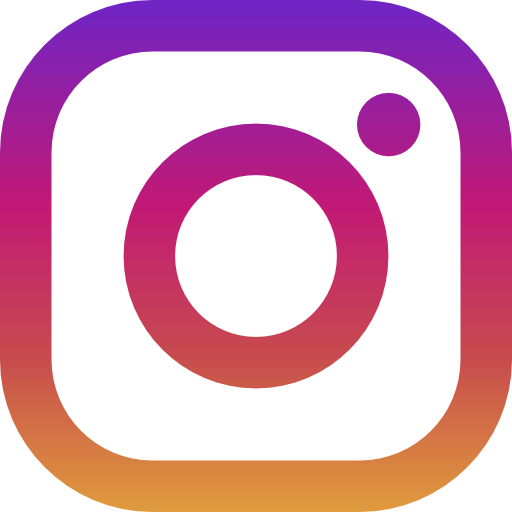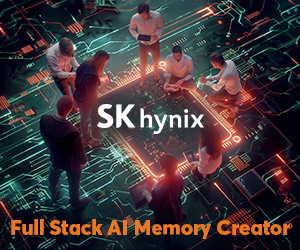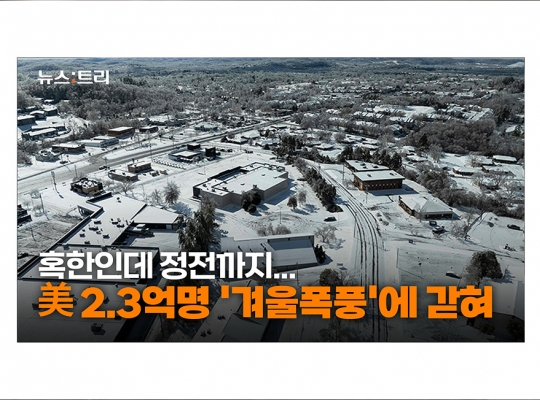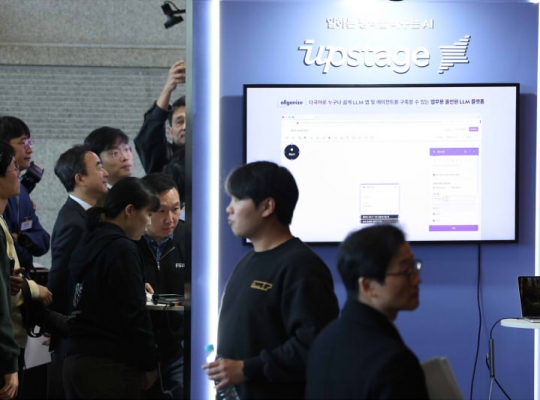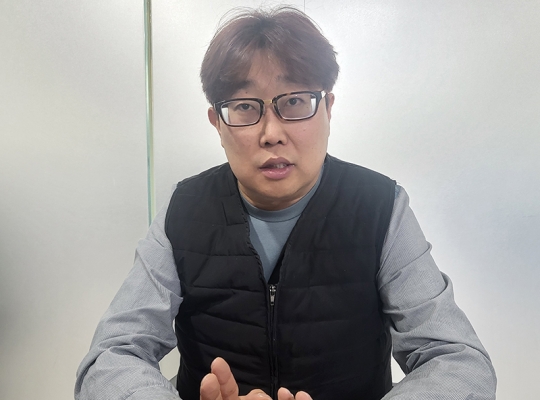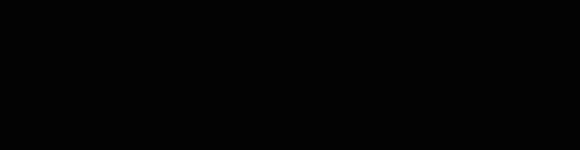기후변화로 지구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견고하기로 소문난 중앙아시아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 빙산의 하나로 꼽히는 남극의 '메가버그'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지 40년만에 바닷물에 녹으면서 몇 주안에 사라질 처지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ISTA)의 프란체스카 펠리치오티 교수 연구팀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타지키스탄 파미르 산맥에 위치한 키질수 빙하의 적설량이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키질수 빙하는 알프스와 안데스산맥의 빙하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이후 강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연구진이 1999년부터 적설량을 분석해보니, 2018년 이후 눈 높이가 평균 0.92m로 1999~2018년의 평균 눈 높이 1.30m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강설량도 1999년~2018년 617㎜에 달하던 연평균 강설량도 2018년 이후 470㎜로 낮아졌다. 총 강수량 역시 1176㎜에서 811㎜로 줄었다. 봄철 눈 녹는 시기도 약 2주 빨라졌다. 특히 봄과 초여름에 눈과 비가 줄면서 전반적인 적설 지속기간이 짧아졌다. 연구팀은 겨울철 적설량 부족으로 눈층이 얇아진 데다, 봄철 기온이 0.19℃ 상승하면서 눈 녹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20년 사이에 강설량과 강수량이 이처럼 줄어들면서 유역의 연간 유출량도 약 189㎜ 감소했다. 다만 부족분은 빙하 융해수가 보충하면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뿐이다. 빙하 융해 기여도는 19%에서 31%로 높아졌다. 강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발산은 오히려 늘어나 유출 비율이 0.75에서 0.70으로 낮아졌고, 이는 지역 수자원 가용성 감소로 이어졌다.
연구를 이끈 ISTA의 아킬레 주베르통 박사과정생은 "키질수 빙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 더 이상 예전처럼 용수를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단지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펠리치오티 교수도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빙하 융해수에 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반건조지역"이라며 "상류지역인 키질수 유역은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커뮤니케이션즈 어스 앤 앤바이런먼트(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 9월 2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나와 40년동안 바다에 떠돌던 세계 최대의 빙산 '메가버그'도 현재 매우 빠르게 녹고 있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올초 발견된 'A23a'로 명명된 이 빙산은 무게가 약 1조톤에 달하는 거대한 담수 덩어리다. 코페르니쿠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 면적은 1770㎢에 달한다. 이는 원래 떨어져 나왔던 크기의 절반이다. 하지만 최근 몇 주동안 400㎢에 달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고, 크고작은 조작으로 쪼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떨어져 나온 크고작은 조각들은 곧바로 바다에 녹고 있다.
이 빙산은 1986년 남극 대륙붕에서 분리돼 웨델해에서 30년간 해저에서 갇혀 있다가 2020년 탈출해 남대서양으로 떠밀려갔다. 그러면서 올초 눈에 띄게 된 것이다. 빙산이 발견될 당시 사우스 조지아섬의 얕은 바다에 좌초돼 그곳에 서식하는 펭귄과 물개들의 서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빙산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바닷물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학자들은 "빙산의 분리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남극에서 빙산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