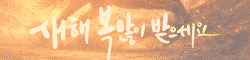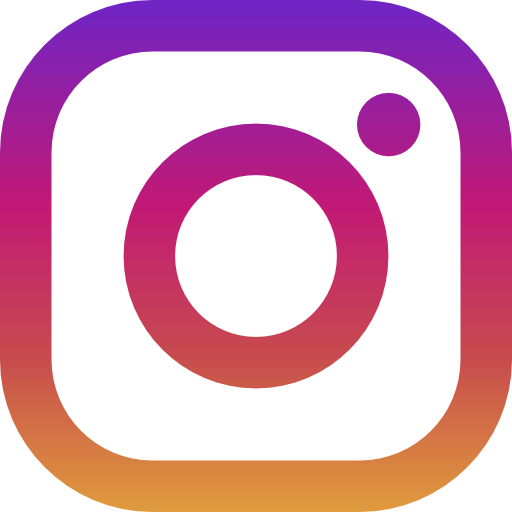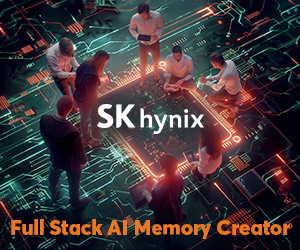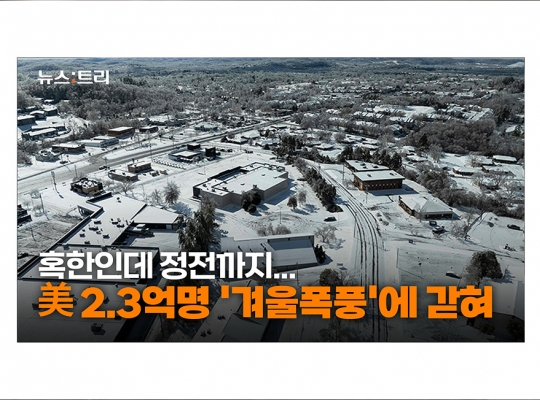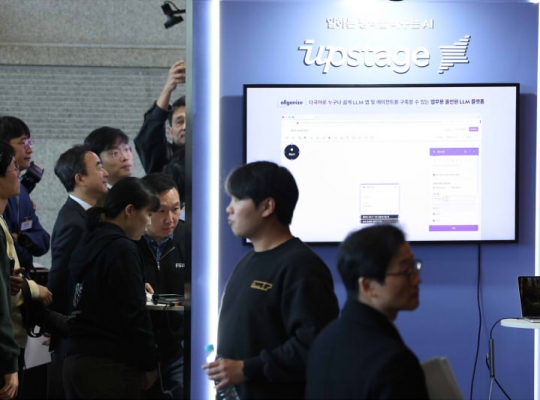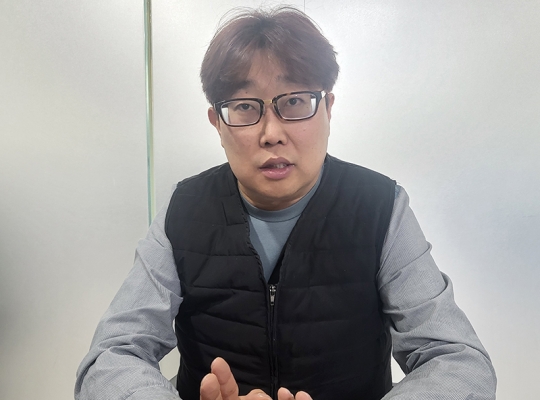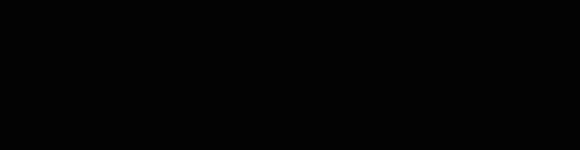태양빛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인공식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DGIST) 화학물리학과 김성균 교수연구팀은 태양에너지로 작동하는 인공식물 소자를 개발해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된 토양을 빠르게 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소자는 식물의 증산작용을 모사해 전력이나 추가 물 없이도 태양빛만으로 세슘을 잎에 모아 정화할 수 있으며, 기존처럼 흙을 퍼올려 세척할 필요가 없어 현장 적용성이 크다.
방사성 세슘(Cs⁺)은 반감기가 길어 오래 사라지지 않고 물에 잘 녹아 환경에 쉽게 퍼진다. 몸에 들어오면 근육이나 뼈에 쌓여 암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오염수는 흡착제로 정화할 수 있지만, 토양은 흙을 퍼올려 세척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여전히 전세계적 난제로 꼽힌다.
이에 자연의 식물을 활용해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돼 왔다. 식물이 뿌리로 오염물질을 빨아들인 뒤 잎이나 줄기에 모아두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거율이 높지 않으며, 날씨나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방사성 물질은 빠르게 제거해야 안전한데, 식물은 성장 속도가 느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 오염된 식물 자체가 방사성 폐기물이 되어 추가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었다.
김성균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의 증산작용을 모사한 인공식물 소자를 개발했다. 이 소자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토양 속 오염된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방사성 세슘만 골라서 잎 부분에 축적한다. 순수한 물은 증발해 사라지고, 증발된 물은 회수 시스템을 통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므로 별도의 물을 보충할 필요도 없다.
흡수된 세슘은 잎에만 남기 때문에, 정화가 끝난 뒤 잎만 교체하면 계속해서 소자를 재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한 잎은 산성 물질로 씻어내면 세슘이 다시 빠져나와 흡착제를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비용과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농도로 오염된 토양 실험을 진행한 결과, 20일 이내에 토양 속 세슘 농도를 95% 이상 줄이는 성능을 확인했다. 기존에 몇 달 이상 걸리던 정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 기술은 방사성 세슘 오염이 심각한 지역 농경지나 사고 현장 토양 복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태양에너지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나 추가 물 공급이 필요 없어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 가능성이 크다.
김성균 교수는 "방사성 세슘 오염은 물보다 토양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동안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자연의 식물을 모사해 별도의 장치 없이 설치만 하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게재됐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