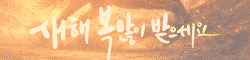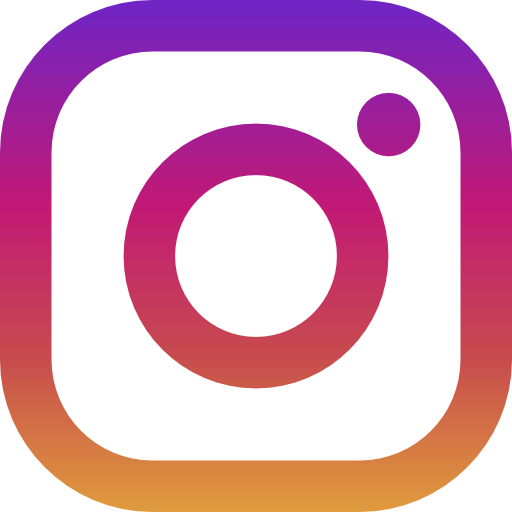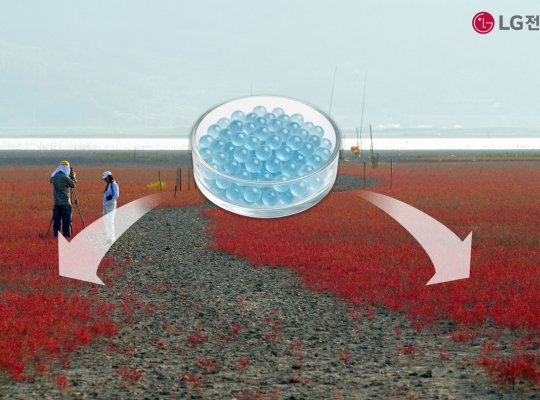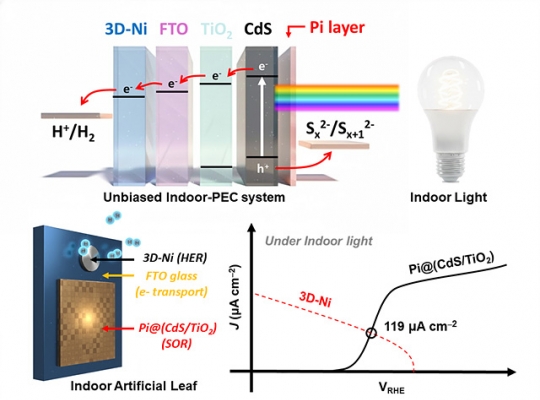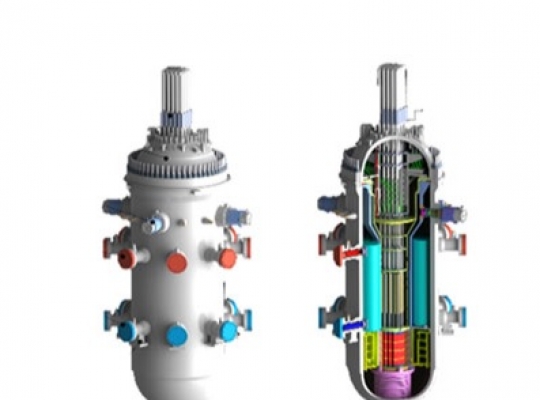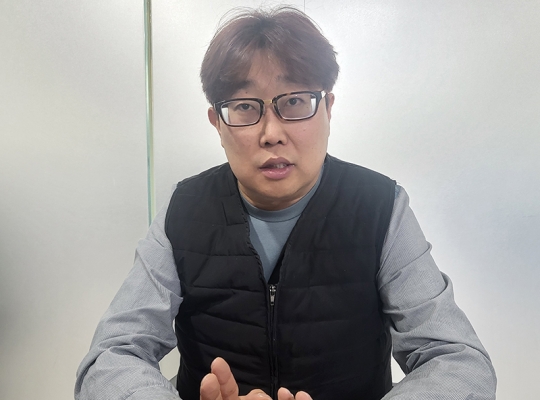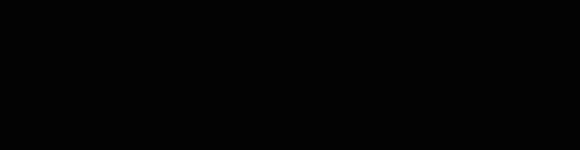빛나는 작품은 지극한 정성과 디테일의 축적

"글쓰기는 개 같은 삶이지만, 그나마 살 만한 유일한 삶이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플로베르는 한 문장에 며칠을 매달렸던 완벽주의자였다. 자신이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병에 걸린 듯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절차탁마 대기만성'이란 말이 생각났다. 혼신의 힘을 다해 작업에 몰입하고 있는 내 지인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 '몰입'
절차탁마(切磋琢磨)는 본래 옥이나 뼈, 돌 같은 재료를 자르고, 갈고, 쪼고, 다듬는다는 의미다. 자기 수련이나 학문 연마 및 노동 숙련을 통해 점점 더 정제되어 간다는 말이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은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말인데, 주로 사람됨이나 인재의 출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알다시피 동양이나 서양에서 그릇은 주로 인간이나 인품을 은유했다. 꿈 해석이나 상징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기(大器)를 말 그대로 도공의 그릇으로 볼 순 없을까? 은유의 차원을 잠시 비우고 이를 작가와 예술가의 실제 작품, 장인이 만드는 그릇이나 작품으로 보면 보다 원초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작품과 작업에 관심이 많은 나는 대기(大器)를 작품으로 보고 '절차탁마' 역시 예술적 차원으로 이해한다. 그럼 작가들의 작품 과정, 우리가 흔히 집중해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추해 보자.
장인, 작가, 작업하는 이들은 자르고, 갈고, 쪼고, 다듬는다. 작업의 과정은 분절과 이음, 조형과 변형, 삭제와 첨가, 섬세함과 리듬을 조성하는 파괴와 창조의 연속이다. 작가는 자신의 몸과 사유, 감각과 노동을 다루고 숱한 반복을 지속한다. 자신의 몸만이 아니다. 작가의 몸과 정서와 감각이 재료들의 물성과 정서와 감각과 만나 서로의 감각을 조율한다.
단어 하나하나, 악보 하나하나, 붓질 하나하나, 섬유 한 올 한 올, 몸짓 하나 표정 하나, 선과 점들로 조형되는 이미지들과 파생되는 흔적들, 이어지는 숱한 컷들과 숏들, 섬세한 손길과 어루만짐이 쌓이고 겹쳐 하나의 작품이 서서히 형성된다. 반복적인 작업과 숙성의 과정을 거쳐 작품의 몸체와 얼굴이 드러난다. 어느 순간, 작품이 온다. 과연 시인과 소설가, 음악가, 화가, 춤꾼, 공연예술가 등 아티스트들은 절차탁마의 화신들이다.
◇ '고통'
작가들은 매일 작업한다. 그들의 일상은 루틴한 작업의 반복, 지속과 생성, 지루함과 인내와 견딤으로 채워진다. 절차탁마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고된 반복의 고통과 집중, 전념이 필요하다.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밤을 버텨야 한다. 자신을 액체 상태로 흘러가게 하면서도 무언가를 생성하는 조형하는 예리하고 정교한 고체성의 힘이 필요하다. 피 말리는 퇴고의 과정과 마무리를 거치지 않고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없다.
세계적인 춤 안무가 피나 바우쉬(Pina Bausch)는 작업 과정의 고통을 이렇게 말한다.
"작품을 하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매번 고문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매번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든다. 하지만 초연이 지나자마자 난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럴 기운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우쉬가 깨뜨리고 다듬는 것은 자신의 몸과 동작이었다. 비단 안무 작업만이 아니다. 글쓰기, 작곡, 연주, 그림, 도예, 영상 이미지, 공예, 공부, 수행 등 모든 종류의 장인 작업은 특이한 감정 곡선을 그린다. 열정과 절망, 지루함과 외로움, 자유로운 상상력과 사소한 오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결벽증, 도취되는 영감과 작업의 단조로움, 초월적인 자유와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야망, 만족감과 영원한 불만족, 평화로운 감정과 때로 치솟는 분노와 짜증, 명상적 태도와 어떤 태만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 이 양자를 오가며 씨름한다.
◇ '절차탁마'
진흙덩이를 불 속으로 내던진다고 절로 토기가 탄생하지 않는다. 빛나는 자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인 혹은 작가의 작업실에는 미완성의 작품과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들은 기다린다. 절차탁마의 축적 위에서 마침내 완성되어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그 출현의 순간을. 이는 발터 벤야민이 말하는 메시야적 순간과 유사하다. 별 하나 하나가 모여 마침내 성좌가 되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말이다. 그 순간은 오래 시간과 기다림 후에 온다. 흩어져 있던 단어 하나하나, 작업 한 컷 한 컷, 악보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모이는 시간의 흐름을 거쳐 그 순간이 열린다. 홀연히 출현하고 완성된다.
"글쓰기는 기도의 한 형태이다."Writing is a form of prayer. 프란츠 카프카에게 글쓰기는 내면의 고통을 구원으로 전환시키는 행위였다. 이를 기도에 비유한 것에서 우리는 그의 창작이 얼마나 절박하고 종교적 헌신에 가까운 몰입이었는지를 간파하게 된다. 어쩌면 창작의 길은 수행자가 선택하는 기도–고행–순례의 과정과 유사할 것이다. 구원 혹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작품은 그렇게 탄생한다. 예술가의 작품 활동이나 문학은 그런 길을 걷는다. 영성이나 내공도 그처럼 축적된다. 사람다운 사람도 그렇게 형성된다. 공부는 그렇게 한다. 기술과 위대한 발견도 그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혁명도 그렇게 한다. 역사도 그렇게 써진다. 우리 삶도 그렇게 작품이 되어간다. 오늘, 지금, 쉬지 않고 절차탁마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이는 안다. 그 비밀을.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